|
|
http://zermoth.net/mabi/library/view/ko/802-002
어느 캠프파이어에서 있던 이야기
A Short Story around Campfire
A Short Story around Campfire<br/>어느 캠프파이어에서 있던 이야기
그것은 어느 여행지에서 있던 일이었다.
들판에 지펴진 캠프파이어의 불빛을 보고 하나 둘 모여든 여행자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음식과 음료수를 나눠 먹으며 담소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야기가 점점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한 꾀죄죄한 여행자가 해준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다. 나는 언젠가 이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리라 생각했고,
몇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 생각을 실행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서술하는 이야기는, 그 여행자의 이야기를 옮겨적은 것이다.
***
내가 이래뵈도 몇년 전엔 잘나가는 모험자였어. 물론 이런 곳에서
왕년찾지 않는 사람 어디 있을까마는, 아마 던바튼에 살던 사람이라면
내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쏜살이 재커라고 말이지.
그때만 해도 아직 던바튼이 교통의 요지로 막 각광받기 시작하던 때라서,
모험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했었지. 당연히 관청에는 모험자들이
잃어버린 무기와 갑옷이 가득가득 쌓였고. 내 전문은 그런 물건들을
몰래 쓱싹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거였어. 굳이 말하자면 도적이랄까?
아아, 이상한 눈으로는 보지 마. 원래 비싼 갑옷이나 물건은
관청에서 되찾는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에 잘 안찾아가거든. 그러면
그 갑옷들을 보관하느라 관청 창고 비용들지, 훌륭한 물건들은 썩어
나가지, 그러다 결국 어떤 물건들은 아예 안찾아가지...
그러느니 나 같은 사람이 재활용시켜주는 게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이봐이봐, 거기 일단 칼 집어넣으라구. 던전 갔다가 물건이라도 잃어버린
거야?
헤헷, 어쨌거나 지금은 그 일도 접은지 오래야. 왜냐구?
어느날 관청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지...
그날도 난 밤늦게 관청을 노리고 있었지.
관청에 쌓이는 분실물들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걸 일일히 챙기진 못해. 그 안에서 한두개가 사라진다고
쉽게 알 수는 없거든.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뒤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야근이라도
하는지 다들 늦게 남아있더군. 그래서 자물쇠를 따고 몰래 건물
안으로 숨어들었을 때는 이미 자정이 지나있었어.
불을 켤 수 없기 때문에 달빛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날따라
이웨카도 잘 보이지 않더군. 나는 더듬거리면서 복도를 따라서
목표하는 방으로 들어갔어.
아니, 들어갔다고 생각했어.
커다랗게 쌓여있는 상자들과 가죽냄새, 철판 냄새... 거기다 약간 퀴퀴한
냄새까지, 평소와 비슷한 느낌에 나는 그곳인줄만 알았지.
그런데, 더듬더듬 상자를 뒤져서 그 중 하나를 열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온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나는 어깻죽지가 빠지는 줄 알았어."
그 순간 얼마나 놀랬는지, 간이 떨어지고 심장이 입밖으로 튀어나오는줄
알았다니까. 화들짝 상자 뒤에 숨어서 누가 있는지 살피려 했지만, 하도
컴컴해서 누군가가 있다는 인기척 외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인기척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거야. 등골이 쭈뼛해지더군. 게다가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
"말도 마, 해골늑대면 양반이지. 자네 검은 그리즐리곰 들고 날라 봤나?"
해골늑대? 검은 그리즐리를 들어? 나는 그대로 멍하니 입을 벌렸어.
"그것도 한두번이지. 이제 난 메탈만 보면 땅에 패대기치고 싶어져."
들려오는 목소리는 한둘이 아니었어. 게다가 메탈 스켈레톤을 땅에다 패대기치다니...
대체 어떤 놈들이 여기에 모여있는가 싶었어. 늦게까지 남아 있는 직원들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직원이라도 결국은 공무원이잖아. 아니면 나같은 생각으로 숨어든
도적단일까? 나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빼꼼 고개를 내밀어 봤지.
그런데 그 순간, 길게 찢어진 번쩍이는 눈들이 보인거야!
생각해 봐, 시커먼 어둠 속에서 파랗게 번쩍이는 눈 수십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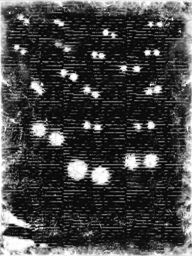 나는 그대로 다시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어.
나는 그대로 다시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어.
대체 뭘까.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달빛이 없어 실루엣도 안보이지만, 구부정하게
모여앉은 모습이 마치 고블린이나 임프 같은 마족같았어.
마족? 크기는 작지만 그리즐리곰을 한손으로 들고 메탈을 패대기칠 정도로
강한 마족? 문득 친구가 던전 안에서 보았다는 블랙 위자드 생각이 나더군.
그러고보니 블랙 위자드가 앉아있다면 딱 저런 크기가 될 것 같기도 했어.
그런 상상을 하자 난 꼼짝도 할 수 없었지. 어째서 관청에 그런
마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또 모르잖아. 던바튼의 관청이 좀 크나?
그 안에 던전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돌 정도니까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이대로는 안되겠어, 계속 이 사태를 방관했다간 큰일이 날 거야."
"맞아맞아. 지금은 최고가 주머니 세 개지만, 나중에 가서 네 개 다섯 개로
늘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잖아."
"더 나쁜 건 뭔줄 알아? 던전까지 오라고 부르는 놈들이야."
"던전은 나아, 가끔은 활로 겨누는 인간까지 있더라구. 건방지게스리..."
목소리들은 나직하게 깔려서 속삭이는데도 섬뜩하게 들리더군. 그렇게
무언가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마구 쏟아내던 그들 사이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인간들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건 맞아. 하지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지?"
파란 눈동자들은 전부 조용해졌어. 그 분위기는 마치 에린에서 쫓겨난
마족들이 다시 에린으로 쳐들어오기 위해 회합을 하는 분위기 같았지.
나는 어서 뛰어나가서 이걸 알려야 하는가, 그런 짓을 했다간 내가 도적이라는
걸 사방에 알리는 꼴이 되니 안되나 하는 양자 택일 중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어.
실은 다른 걸 다 제치고 도망가고도 싶었지만, 도저히 저 파란 눈들에게
들키지 않고 도망칠 자신이 없었거든.
"...우린 어쩔 수 없어."
"왜?"
"자네들, 나오나 던컨과 정면으로 붙어서 이길 자신 있나?"
"......"
나오라면 여행자들을 돌봐준다는 신비로운 소녀이고... 던컨이라면,
티르코네일의 그 유명한 촌장 말인가?
"게다가 페트록 그 첩자가 일러바치면 말짱 헛거란 말이야."
"크흑, 나쁜 놈. 아무리 나오가 이쁘기로서니, 동족을 배신하고..."
"그러는 자네도 나오가 주는 일거리를 받으려고 줄서서 기다렸잖아."
"그러는 자네는 에반하고 거래하는 게 좋다면서 여기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
아니 이럴수가...
나오나 에반이 일거리를? 마족에게?
설마 하니, 며칠마다 한번씩 나오에게 잡혀간다는 농담을 하는
모험자들이 있다던데, 그런 건가? 이 수많은 분실물들을 찾아오는데
몬스터들을 고용한다는 소문도 있더니 그게 정말 사실이었나?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 만약 관청 직원인
에반까지 마족들과 한통속이라는 게 들통났다는 걸 알게 되면 날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된 이상은 관청에 신고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이젠 빨리, 그것도 나 혼자의 힘으로 여기에서 도망가야만 했어. 손발이
다 떨렸지만 그래도 들키지 않고 나가기 위해 살금 몸을 돌리는 순간...
빠직!
그만 바닥에 놓여있던 상자뚜껑을 밟아버린거야.
그와 함께,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수십쌍의 눈동자가 한꺼번에 나를
향했어.
"인간?!"
"봤나?"
"들었지!"
"지금 그 말, 들었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고일의 날개짓소리와 함께 외치는 섬뜩한 푸른눈들...
나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면서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고 말았어. 악마들이
나를 쫓아와 그대로 뒷덜미를 낚아챌까봐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어. 도망치다가 넘어져서 발톱이 빠지고 몇번을 굴렀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았지...
그 뒤로 나는 다시는 던바튼에 얼씬거리지 않았어. 물론 관청을 터는 것은
생각도 못하게 되었고 말이야.
자네들도 잊지 말라고. 던바튼 관청의 에반이나 모험자들을 도와주는
나오는, 사실 마족과 손을 잡은 마녀들이라는 걸 말이야.
물론 티르코네일의 그 촌장 영감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걸...
***
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뒤
던바튼에 직접 가서 에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던 나는 아름다운 에반에게 몇년 전 관청에 도둑이 들었던
일은 없느냐 물어보았다. 만약 재커라는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름다운 에반은 잠시 옛일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정중한 태도로
나에게 대답했다.
"글쎄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하지만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니...
몇년 전, 관청에서 키우는 부엉이 우리에 도둑이 들어서는 보관을
위해 임시로 놔뒀던 상자와 큰 통을 다 엎어버리고 도망갔던 일은
생각이 나는군요."
 나는 다시 쏜살이 재커를 만나지 못했지만, 누군가 그를 만나게 된다면
소심하고 멍청했던 불쌍한 도적의 오해를 풀어주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어쩌면 오해를 풀지 않는 쪽이 더 자비로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다시 쏜살이 재커를 만나지 못했지만, 누군가 그를 만나게 된다면
소심하고 멍청했던 불쌍한 도적의 오해를 풀어주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어쩌면 오해를 풀지 않는 쪽이 더 자비로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게 인생 아니겠나?
|
|